파주출판도시 ‘파주 북소리 축제’에 가다
파주는 일탈이자 환상이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항상 쉼과 낭만,여행의 느낌이 가득 드는 곳이다. 책,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 안착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재미를 준다. 작년에 너무 고생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파주출판도시의 가을 축제
‘파주 북소리 축제’에 다시 갔다. 안 갈 수 없었다. 나를 다시 고생길로 이끈 사람의 소개는
잠시 후 하겠다.
파주출판단지 1단지는 출판사 건물이 가득하지만 , 2단지에는 영화사와 영화 스튜디오,
특수 촬영 회사, 영상자료원 파주보존고가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파주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배경이었던 명필름이 종로구 누하동에서 파주로
이전했다.
둘째 날은 명필름 대표, 마지막 날은 ‘영화평론가 정성일’이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했다.
그렇다. 나를 다시 파주의 가을축제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영화 평론가 정성일’이다.
나를 영화 마니아로 만든 남자
나는 영화를 좋아했지만 진중하게 보는 재미는 몰랐다. 그저 시험이 끝나면 집에 숨겨 놓은 과자를 꺼내듯 오전에 시험을 마치고 종로 극장가에서 배트맨이나 다이하드 볼 궁리만 했다. 당연히 나의 영화 선택 기준은 ‘재미’ 딱 하나였다. 주로 흥행 영화나 대중성 높은 영화만보며 살았다. 그러다 재미보다 삶의 시선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영화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을 알게 됐다. 지금도 자주 듣는 MBC FM 영화음악에서 정성일 영화평론가는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아주 맛깔스럽게 소개했다. 그때를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아나운서 정은임의 FM 영화음악에 출연해 다양한 영화를 소개해줬고, 그 영화음악을 들으며
나는 다양한 영화를 보는 영화 마니아가 되어갔다.

이야기도 정성일 영화평론가에게 들으면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듯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
졌다.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았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다.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만들어낸 시네필들이 꽤 많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반석이 된 시네필
태반을 그가 양산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 마니아 사이에서 추앙받는
영화평론가다. 매번 영상과 목소리만 듣다가 직접 얼굴을 보게 된 거다. 정성일 평론가는
한 시간 예정 강의를 두 시간 이상 했고, 질문 하나하나 모두 받았다. 열정적인 강의였다.
그는 말도 잘하고, 말하는 것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두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이야기가
꽤 나왔다.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중영화와 예술영화의 구분, 영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추천하는 영화 10편을 소개했다. 그가 한 이야기 중 가장 마음 아픈,
그러나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소개하려 한다.
어떻게 1년에 천만이 넘는 영화가 두 편이나 나올 수 있었을까?
보지는 않았다.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영화 자체로만 보면 둘 다 별 세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그런 킬링타임용 영화로 보였다. 1천만 관객 기록이 영화를 평가할 절대적 잣대인
시대는 지났다. 천만 관객은 영화 자체도 좋아야겠지만, 영화 배급사의 농간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손에 찝찝한 팝콘 기름이 묻는 줄도 모르고 입에 들어가면 달콤한, 말초적인
재미만 추구하는 영화들이 늘고 있다. 딱, 팝콘 먹으면서 보기 좋은 영화들이 더 인기다. 잠시
딴 짓을 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와도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 말이다.
영화평론가 정성일은 어떻게 1년에 관객 1천만 명을 넘긴 영화가 두 편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국 사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다는 지적이다. 한국 연간 영화 관람객 수가 2억 명
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한국인 1인당 영화관람 횟수는 연간 4.12회다. 영화 발원지인
유럽과 영화 공장이 있는 미국을 뛰어넘는 숫자다. 무례 세계 1위다. 좋은 의미의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1인당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에 살고 있다.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나쁜가?
영화를 많이 보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할 수 있다. 맞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정성일영화평론가는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영화관에 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서양의 20대들은 모이면 여행하거나 교외로 나가서 논다. 한국의 88만 원 세대는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차도 없고 돈도 없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가까운 영화관에 간다고
한다. 공감이 갔다. 나는 영화를 좋아해서 좋은 영화라면 찾아가서 보는데, 영화관에 가보면 주말 관객의 8할은 20, 30대 데이트족이나 친구와 온 관객이 많다. 가족 관람객도 있지만
영화관의 주 소비층은 20, 30대다. 내 20대를 돌아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때는 영화
한 편 보려면 종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지만, 영화 말고 따로 할 것이 많지 않았다.
남자 친구들과 만나면 당구치고, 술 먹고, 노래방에 갔다. 이성 친구와 만나면 영화 보고
커피숍에 가거나 술자리로 끝. 정말 갈 곳 없는 청춘이었다.
지금은 90년대보다 갈 곳, 즐길 것이 많아졌지만 가장 만만한 장소가 영화관이다. 특히
슬리퍼 끌고 가도 될 지근거리 복합상영관은 변두리 재개봉관과 비디오 가게를 싹 몰아냈고,
전국 곳곳에서 관람객을 흡입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썼더니 지방은 영화관이 많지 않다고 하소연을 한다. 정성일 평론가는 영화관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영화관만 가는 것을 지적하는 거다. 영화관 말고도 대안은 많다. 돈만 있으면 쏘카 같은
자동차 렌트 서비스로 동해를 보고 올 수도, 하룻밤에 20~30만 원 하는 경기도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다. 낚싯배타고 섬에서 낚시도 가능하다.
영화관에 가는 이유
하지만 20대는 돈이 없다. 가격대비 만족도 높은 영화관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다. 물론, 영화관도 연인과 영화표 가격보다 비싼 팝콘과 콜라 사서 보면 주말에는
약 5만 원 이상 지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 어떤 활동보다 시간당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이
영화관이다. 주말에는 영화관 입장료가 비싸지만 요즘 제값 다 주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신용카드 혜택과 쿠폰, 이리저리 할인해서 보면 저렴하게 볼 수 있다. 천 원이라도 아끼려
조조관람을 하는 젊은 층도 꽤 된다.
이런 형태로 영화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나라가 또 있다. 바로 인도다. 인도 영화에서
배우들이 뜬금없이 춤추고 노래하는 이유다. 인도에서는 집에 TV는 없어도 영화관은
동네마다 있고, 유일한 유희거리가 영화 관람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점점 인도와
닮아가는 것 같다.
나도 영화를 많이 보지만, 한국 사람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영화관을 쉽게 찾는다. 분명 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2차 시장인 비디오나
DVD 대여 시장이 붕괴했고, IPTV나 다운로드 시장이 열렸다고 하지만 영화관 시설은 그보다
더 좋아졌다. 조금 더 돈을 내고 외식도 할 겸 하나의 주말 놀이문화로 정착한 느낌이다.
추천받거나 대박 영화를 보기보다 일단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결정하고, 가장 볼만한 영화를
찾는 문화도 점점 퍼지는 것 같다. 20대는 돈이 없어 영화관에 가고, 아이들이 있는 30, 40대
들는 영화 관람 문화가 정착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가 됐다.
정성일 영화평론가는 영화관 말고도 갈 곳이 많을 젊은 층이 영화관에서 튼 에어컨 바람
밑에서 두 시간을 보내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물론, 정성일 평론가의 말을 100% 공감할 순
없다 해도 유의미한 지적임은 분명하다. 주말이면, 한국의 10, 20대는 영화관에 간다.
30, 40대는 아이들과 놀이동산이나 아이가 원하는 곳에 따라간다. 50, 60대 이상은 전국
산이란 산에 다 올라가 있다. 세대별로 가는 곳이 다 다른 모습이 지금의 한국 아닐까.
다시 말하지만, 영화관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영화관밖에 갈 곳이 없는 한국의 현실,
특히 20대가 영화관만 가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글이다. 인구 5천만인 나라에서
1년에 영화관에 2억 명이 가는 나라. 우린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원문: 사진은 권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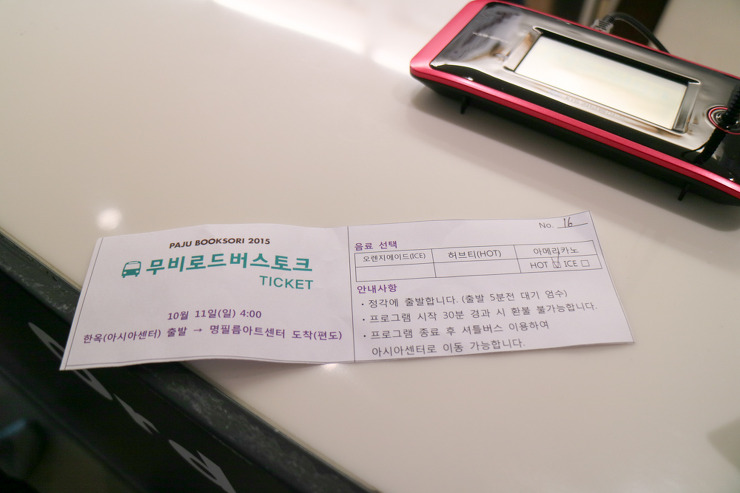


댓글 없음:
댓글 쓰기